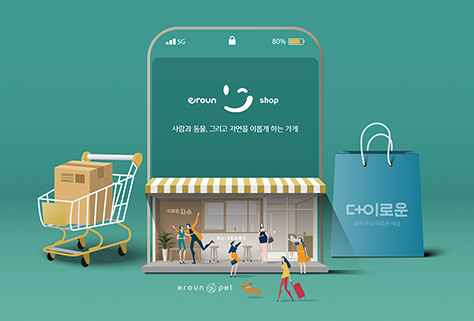파주시청 근처에 7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순댓국집이 있다.
직접 만든 순대로 파주를 넘어
경기도의 맛집으로 성장한 큰손집이다.
사진. 전재호


“요새 다들 어렵잖아요. 이렇게 내 일처럼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도민의 글을 읽으며 힘을 얻었어요.”
김밥집을 운영하는 홍용준 사장의 말이다. 그는 “울컥했다”고도 했다. 진행된 이벤트 중에는 도내에서 잘 아는 우리 동네 맛집을 소개해달라는 댓글 달기가 있었다. 도의 동서남북으로 많은 집이 소개됐다. 필자는 파주의 ‘큰손집’을 찾았다. 금촌 맛집으로 유명하다는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 신윤성(73)·지정옥(71) 부부가 38년 전에 열어 이제 노포가 된 순댓국집이다.
“우리가 파주 토박이예요. 생활하려고 연 식당이죠. 처음엔 뭘 알았겠어요. 지인이 하는 가게 중 잘하는 순댓국집이 있었는데, 거기 일하는 분을 알게 되어 하나 차렸지요. 고생 많았어요. 무 3,000개씩 김치를 담그고요. 초기에는 서울 마장동에서 돼지 사골을 받아왔어요.”

국물이 적당히 진득하고 시원하다.
무엇보다 냄새가 없다. 깔끔하면서도 깊다.
새우젓도 얼마나 싱싱한지 몸체가 선명하게 보인다.

“우리야 지금은 자리를 잡았지만, 순댓국이 쉬운 음식은 아니에요.”
1대 주인인 어머니 지정옥 씨의 말이다. 그이는 주방에서 쉼 없이 움직인다. 사골을 반나절 이상 끓여야 하고, 머릿고기도 삶아야 한다. 틈틈이 순대를 만들고, 고기를 다 삶은 후에는 썰어서 부위별로 나눠둔다. 내장도 손질하고 김치도 담가야 한다. 간단한 메뉴 한 가지인데도 일이 이렇게 많다.
“대충 하면 손님이 먼저 알아요. 순대는 이제 아들이 맡아서 합니다.”
요새 순대를 직접 만드는 집은 거의 없다. 일손이 비싸고, 또 공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집의 인기 비결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하는 순대의 맛이다. 고기와 채소로 빼곡하게 채운 질 좋은 순대가 넉넉히 들어간다. 내장을 맛있게 섞는 것도 비결 중 하나다. 오소리감투(돼지 위), 창자, 염통이 들어간다. 그래서 더 번거롭고 복잡하다. 한 그릇에 1만 원. 요즘 물가에 싸다고도 비싸다고도 할 수 없는데, 내용물을 보면 싸다고 믿게 된다. 담근 깍두기에 제철로 내놓는 열무 얼갈이김치도 시원하다. 이런 서비스가 이 집의 가치를 말해준다.


“새벽에 나와 밤에 들어가지요. 일이 많아요. 하루 종일 일해야 먹고사는 것이라.”
인상 좋고 후덕한 안주인 지 씨는 취재 내내 촬영팀에게 친절했다. 따뜻한 공기가 가게에 흐르는 것은 꼭 뜨거운 뚝배기에 담아내는 순댓국 때문만은 아니다. 막걸리 한잔 걸쳐서 순댓국을 너무도 맛있게 비웠다.
이 집은 여러 독자가 소개해주셨다. user-tw8ik4eh9u님은 “파주 큰손집 아직도 순대를 직접 만드시는 것도 놀라운데 반찬들도 정갈해서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썼다.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누군가는 ‘글 쓰는 셰프’라고 하지만 본인은 ‘주방장’이라는 말을 가장 아낀다.
오래된 식당을 찾아다니며 주인장들의 생생한 증언과 장사 철학을 글로
써서 사회·문화적으로 노포의 가치를 알리는 데 일조했다.
저서로는 <백년식당>, <노포의 장사법> 등이 있고 <수요미식회> 등 주요 방송에 출연했다.
문의 031-944-8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