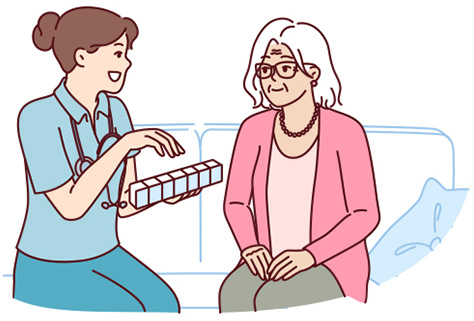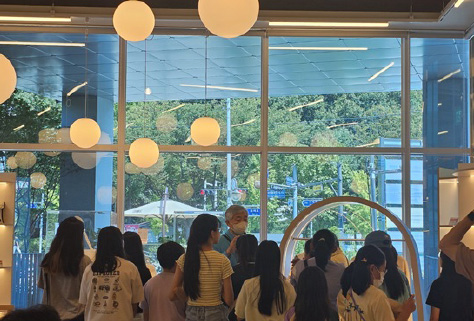누군가는 ‘글 쓰는 셰프’라고 하지만 본인은 ‘주방장’이라는 말을 가장 아낀다. 오래된 식당을 찾아다니며 주인장들의 생생한 증언과 장사 철학을 글로 써서 사회·문화적으로 노포의 가치를 알리는 데 일조했다. 저서로는 <백년식당>, <노포의 장사법> 등이 있고 <수요미식회> 등 주요 방송에 출연했다.
이 칼럼은 늘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완성된다. 이번 호는 ‘송내 맛집’을 잘 안다는 지역 지인이 귀띔해준다.
갈치와 고등어 전문 식당이다.
사진. 전재호

문우제 셰프가 직접 기술자에게 주문해서 알루미늄으로 만든 특수 전골 냄비다. 예쁘고 든든한 그릇이다. 은빛 냄비에 빨간 조림이 익어가니 더 맛깔스러워 보인다.




“가게 쉬는 날이 없어요.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일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하고요. 동생도 합류해서 홀에서 일합니다. 가족 노동이라 남보다 2배 이상 일한다고 해야 할까요.”
가족의 힘으로 꾸려가는 가게이니 거의 쉬지 않고 일하는 셈이다. 생각해보면,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요새 경기 안 좋다, 가게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어렵죠. 저희보다 더 어려운 가게가 워낙 많아서요.”
청년 셰프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진다. 그래도 이 일대에서 제일 잘되는 가게 중 하나인데, 만만치 않은 요즘이다. 이 가게는 가격도 착하다.
고등어는 직화로 구워내기 때문에 껍질이 바삭하고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노란 뱃살은 입에서 살살 녹는다. 부천 막걸리를 한잔 곁들이니 천국이 따로 없다. 갈치는 목포의 먹갈치다. 두툼하고 크다.
“동네 장사라고 하잖아요. 생선 크기 같은 거 마음대로 줄이지 못해요. 단골들은 다 알거든요.(웃음)”
어머니가 찬을 맡아서 만드는 집답게 반찬도 입에 붙는다. 친척 중에 농사짓는 이가 있어서 채소를 많이 보내준다. 취재 갔을 때 마침 문 셰프의 어머니는 가지를 손질하고 있었다. 마트에서 흔히 보는 반듯한 가지가 아니라 막 자라서 크고 울퉁불퉁하다. 취재할 때 그 가지를 무쳐서 내왔다. 손맛이 느껴지는 가지무침이었다.
생선구이와 찜을 주문했는데, 내오는 그릇이 예사롭지 않다. 문우제 셰프가 직접 기술자에게 주문해서 알루미늄으로 만든 특수 전골 냄비다. 예쁘고 든든한 그릇이다. 은빛 냄비에 빨간 조림이 익어가니 더 맛깔스러워 보인다.
경기도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세운 원칙이 있다. 수수한 동네 맛집, 사람 좋은 식당, 마음으로 하는 가게. 그 원칙에 딱 들어맞는 집이었달까. 조림 국물에 밥을 비벼서 먹었다. ‘과식하게 만드는 집’이라고 덧붙여야겠다.